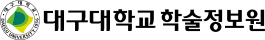꾀꼬리를 부르는 소년
- 저자
- 구사카 게이스케
- 출판사
- 추리작가협회
- 출판일
- 2009-12-21
- 등록일
- 2006-10-18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50 Bytes
- 공급사
- 우리전자책
- 지원기기
- PC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구사카 게이스케의 추리소설 [꾀꼬리를 부르는 소년]입니다.
<b>맛보기</b>
산이라고 해도 해발 2백 미터도 안 된다. 그래도 거기 서 있으면 나뭇그늘 사이로 세도나이카이의 바다가 보인다. 바다는 초봄의 햇빛을 받아 초록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삼나무가 한 그루 우뚝 서 있었다. 수령은 천년을 넘을지도 모른다. 두 발이 넘는 나뭇줄기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다. 그러나 나무꼭대기는 몇 해 전에 벼락을 맞아 무참히 쪼개진 채였다.
그 아래 한 쌍의 이나리 석상(민간 신앙으로 여우의 석상)이 있었다. 석상에는 모두 이끼가 끼어 있고 오른쪽 여우는 귀가 한쪽 떨어져나간 채였다.
안쪽으로 작은 당집이 있었다. 널빤지 지붕은 기울어졌고 수북이 싸인 낙엽 사이로 잡초가 무성했다.
당집 계단에 사나이가 걸터앉아 있었다. 너절한 카키색 작업복과 고무장화 차림에는 걸맞지 않게, 얼굴은 창백해 보였다.
울창한 숲이 당집을 둘러싸고 있었다. 침엽수는 벌거벗은 채였고 어디선지 꾀꼬리가 울고 있었다. 그러나 짹짹거리는 울음 소리로 보아 새끼인 듯했다.
산길 쪽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나이는 찬물을 끼얹은 듯 놀라 얼굴을 들었다. 담배꽁초를 급히 밟아 끄고 허리에 찬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웅크렸다.
세 아이들이 나뭇가지를 꺾어들고 흔들면서 가까이 오고 있었다. 그들의 울긋불긋한 옷차림이 나뭇잎 사이로 언뜻언뜻 보였다. 사나이는 다시 두 팔 사이에 얼굴을 파묻었다.
그러나 아이들은 당집은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갔다. 아이들의 웃음 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기다려 사나이는 숨을 내쉬었다. 깊은 한숨이었다.
그리고 손목시계를 보았다. 시계바늘이 젖어 있었다. 사나이는 비로소 자신이 울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오후 3시를 지난 시간이었다.
부드러운 오후의 햇볕 아래 꾀꼬리는 아직도 울고 있었다.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구사카 게이스케의 추리소설
<b>꾀꼬리를 부르는 소년</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