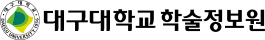아들아, 서른에는 노자를 만나라 - 시인 장석주가 전하는 1만 년을 써도 좋은 지혜
- 저자
- 장석주
- 출판사
- 예담
- 출판일
- 2014-01-17
- 등록일
- 2015-02-13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36KB
- 공급사
- 우리전자책
- 지원기기
- PC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시인의 마음으로 들여다보고, 아비의 마음으로 풀어내다
“혹한의 겨울일수록 봄은 더 찬란해진다”
도와 자연을 말하는 노자 사상, 삶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그렇지만 함축적인 표현, 다양한 해석으로 어렵게만 느껴진다. 시인 장석주는 2000년 여름, 시골로 내려가 느린 삶을 시작했다. “몸도, 마음도, 돈도 다 거덜나버린 상태여서 마치 지푸라기를 잡는 듯한 황막함이 없지” 않았던 그때 『노자』가 다가왔고 그 속에서 자신만의 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백 번이 넘게 읽으며 이제야 조금 『노자』를 알 것 같다는 저자는 그 누구보다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노자』에 대해 알려주고 싶었다. 순전한 그 마음을 이제 독자들과 함께하려 한다. 그저 학자가 아니라, 시인의 눈으로 들여다보고 아비의 마음으로 풀어낸 이 책은 『노자』를 어렵기만 한 동양고전이 아닌, 우리 삶에 밀접한 살아 있는 이야기로 느끼게 할 것이다.
아들아, 네가 바다 건너 먼 나라로 떠난 뒤 얼굴 맞대고 얘기할 기회가 없어졌구나. 물론 한집에 지낼 때도 그렇게 많은 얘기를 나누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멀리 떨어져 있으니 그 멀리 떨어져 있음을 빌미 삼아 더 많은 얘기를 나눌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애비가 생각해낸 것이 이메일이란 수단을 빌려 편지를 쓰는 것이다. 네게 잔소리를 하기 위함은 아니다. 그저 나날의 일들과 감회, 먹고사는 일의 고단함과 보람, 자연의 변화,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마음의 무늬 그리고 사람 사는 도리에 대해 속내 드러낸 얘기를 나누고 싶구나. 애비는 그 방편으로 오래 곁에 두고 읽은 『노자』를 꺼내 들었다.
- 본문 12쪽
노자에게 묻고, 아들에게 답하다
“물어라, 흐르는 강물에게”
저자는 『노자』를 읽으며 무엇보다 비움과 무위, 이름 없는 소박한 삶에 경도되었다. 『노자』 81장 중 저자의 마음을 울린 29장을 선별해, 각 장의 중심 사상을 살펴보고 저자 자신의 삶과 생각, 우리네 현실을 녹여냈다. 겨울에서 시작해 봄, 여름, 가을, 그리고 다시 겨울로 돌아오는 구성 속에서 사계절의 아름다움은 물론, 거대한 자연과 우주 안에서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는다.
그 중심에는 아들에게 전하고픈 메시지가 자리하고 있고, 각 꼭지 마지막에는 아들에게,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전하고픈 삶의 해법을 건넨다. 스스로도 『노자』를 다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저자는 『노자』에 대해 공부하며 깊이 사유하고 깨달음을 얻었지만 결코 누구를 가르치려 들지 않는다. 노자의 철학과 그 안에서 사유했던 자신의 생각을 풀어낼 뿐, 삶의 무게감에 짓눌려 살아가는 우리네 청년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려 할 뿐이다.
아들아, 반세기를 넘겨 산 사람의 지혜로 말한다면 인생은 무엇이 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일까? 하나의 해답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개의 길이 있을 것이다. 그 길이 어떤 길이든 타고난 너 자신, 즉 너의 본성과 직관이 가리키는 길을 따르도록 해라. 아울러 항상 존재의 기쁨과 살아 있다는 기쁨을 오롯이 받아들이도록 해라. 몸과 마음을 소박하고 고요한 데 두되, 작은 기쁨들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마라.
- 본문 75쪽
무엇보다 장석주 시인에게서 문학을 빼고는 그의 인생을 논할 수 없음을 느낄 수 있다. 공립도서관을 드나들며 습작을 하던 시절 얼마나 무력했는지, 그럼에도 꿈을 포기할 수 없었던 심정은 어땠는지, 최근 영랑시문학상을 받은 감회는 또 얼마나 가슴 뭉클했는지, 이를 통해 우리는 저자의 개인사 또한 엿본다. 그의 시 세계를 이루는 근본에는 결국 자연과 삶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다.
노자, 자신의 삶과 생각, 그 속에서 아들에게 전하고픈 메시지가 어우러져 이 책은 또 하나의 우주를 이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