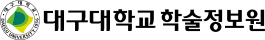모스크바, 1957년 서곡
- 저자
- 공영희
- 출판사
- 청어
- 출판일
- 2012-08-28
- 등록일
- 2012-12-03
- 파일포맷
- COMIC
- 파일크기
- 720 Bytes
- 공급사
- 우리전자책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1957년 모스크바, 과연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민족의 아픔과 이념의 소용돌이를 생생하게 담은 공영희 장편소설
모스크바의 겨울밤은 길고 깊었다.
인적 없는 거리의 가로등 불빛으로 미친 듯이 휘몰아치는 눈보라를 바라보며 모스크바의 겨울을 지냈다. 그때, 나는 생각했다. 도스토예프스키나 솔제니친의 소설 속에 나오는 시베리아 유형지를. 러시아의 어둡고 긴 극한의 겨울밤에 나는 ‘참으로 고독했고 고향을 떠난 자의 슬픔은 떠난 자만이 알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 제임스 조이스가 고향인 더블린을 떠나 파리로 왔을 때 친구에게 ‘파리는 너무 커 슬프다.’라고 편지를 썼듯이 나는 모스크바가 너무 커 외롭고 슬펐다.
시간이 흐를수록 뭔가 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아니, 살 수 없었는지도 몰랐다.
모스크바에서 만난 특별한 인연들, 그분들과 나는 오랜 시간 정치, 경제, 문화, 예술에 대해, 그리고 조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고 정을 나눴다.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역사의 한 뒤안길에, 그분들은 있었다.
나는, 암울하고 불행했던 그분들의 시대를 머릿속에 그리며 이야기꾼의 상상력을 지폈는데 상상은 이미지화를 원했다. 그것은 소설이었다. 소설은 소설이다.
이게『모스크바, 1957년 서곡』이 태어난 배경이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올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아마 몰랐을지도, 아마 알았을지도 모르겠다.
역사는 누가 만드는 것일까, 역사 속엔 누가 존재하는가, 한 개인에게 국가는 어떤 존재인가.
세상은 의문투성이고 오리무중에 싸여 있다. 산을 휘돌아 감싸고 있는 회색의 농담(濃談)을 가진 안개, 그것인지도 모른다.
- ‘작가의 말’에서